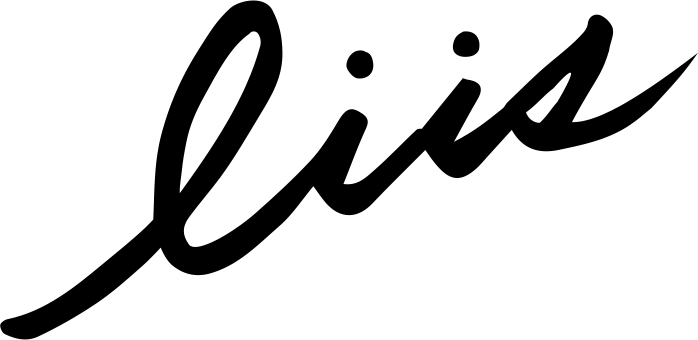최근에 도자기 접시를 구매를 했다. 내가 그 접시를 샀던 이유는 단 하나,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자기 접시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우연'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왜 우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우연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대학 전공 수업 중에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고, 리포트를 써오는 과제가 있었다. 단발머리의 커다란 눈을 가지고 미소가 아주(?) 무서운 '안톤 시거'라는 캐릭터가 인상적인 영화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수업시간에 교수님과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교수님의 일방적인 해석에 가까웠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나는 이 시간이 참 재미있었다.)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이 영화는 '우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다. (아래에 다소 무서운 사진이 먼저 나온다... 주의!)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영화 초반에 나오는 살해 장면에서는 목이 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다리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버둥거리는 발이 만들어내는 바닥의 스크래치 자국은 잭슨 폴록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물감을 흩뿌리고 던지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우연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 똑같이 물감을 던진다고 해서 똑같은 작품이 나올까. 잭슨 폴로의 작품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는 똑같이 행할 수 없는 우연의 현장을 포착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그 발버둥 치는 장면에서 보이는 발자국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흔적들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다.

영화에서 (장소나 상대 인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안톤 시거가 무언가를 사고, 가게의 주인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그때 구겨진 포장지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있다. 구겨진 포장지는 한번 구겨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포장지를 구긴다고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구겨지지 않는다. 영화 속 포장지는 바로 '우연'의 모습인 것이다. 실제로 안톤 시거와 사장이 나누는 대화에서 동전 던지기를 시도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다행히(?) 마켓 사장은 살 수 있었다. 동전 던지기 또한 똑같은 힘으로 던진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우연'을 가장한 '운'의 시험이다.
제목만 보면 노인과 관련된 영화일 줄 알았는데, 살인마가 나오고 나에게는 공포영화만큼이나 무서웠던 이 스릴러 영화는 '우연'에 관련된 영화라는 교수님의 해석을 더해 나에게 인상 깊은 영화로 기억되었다.

영화를 봤을 때 즈음, 과제 때문에 이재효 작가의 개인전을 보러 갔었다. 이재효 작가의 작품 중에 못을 나무에 박고 불로 그을려서 표면을 깎은 작품이 있다. (작품명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작품의 못들이 박힌 모습은 다 제 각각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망치로 아무리 똑같은 힘으로 내리친다 할지라도 각도에 따라, 순간의 힘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박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연'한 그 순간으로 박힌 못들은 우연한 그 시간을 간직한 채 멀리서 보면 마치 이슬이 맺힌 것 같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모습의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이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타의적으로(?) 전시회를 많이 다녀야 했지만, 전시회를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인생 전시회가 있었다. 바로 리움에서 열렸던 '칼더 개인전'이다. 모빌의 창시자로 알려진 칼더의 작품을 보면 한 순간도 똑같은 장면이 없다. 전시장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빌은 내가 보는 각도와 공기의 흐름과 시간 등등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을 했다. 한 작품을 보는데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똑같은 모빌이 '우연'의 시점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났다. 나는 모빌이 주는 그 '우연'의 시간 속에 푹 빠져서 한동안 그 전시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교수님이 앞서 말한 영화들과 전시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공산품보다 수제품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완벽함보다는 '우연'을 통해 만들어진 물건의 그 순간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로봇이 그린 그림보다 사람이 그린 그림에 더 가치를 두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연'의 손길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연'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다시 구현해낼 수 없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연'이다.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련하면서 아쉬운가. 그때의 아름다움과 순간 발생한 기쁨을 찰나의 시간으로 다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을 안달 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재현할 수 없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그 '찰나'를 간직한 무언가를 소장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텀블벅을 통해서 '파인애플 플레이트'라는 접시를 구매하게 되었다. 펀딩의 리워드 제품은 버려진 흙으로 만든 도자기 접시였다. 직접 손으로 만들고 버려진 흙들을 랜덤하게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색도 모양도 각기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내 손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나는 어떤 접시를 받게 될지 알 수가 없다.

평소 소비를 잘 하는 편이 아니지만, 앞서 본 것처럼 나는 '우연'의 매력을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연에 의해서 탄생하게 될 이 도자기 접시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다. 그래서 뭐에 홀린 듯 구매를 했고, 얼마 전 막 도착한 파인애플 플레이트 4 접시들은 내 마음을 충족하기에 그지없었다. 이 접시를 만든 분은 최대한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겠으나 (나의 예상대로) 전혀 똑같지 않았고, 삐뚤빼뚤했으며, 컬러도 흙들의 문양도 제 각기 달랐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접시들은 내가 참 좋아하는 '우연'을 지름 약 12cm인 원 안에 가둔 느낌이었다.

접시를 사용할 때마다 느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마블링 모양은 어떤 순간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 두께는 얼마만큼의 힘이 닿아서 만들어진 것일까. 심지어 4 개의 접시들은 어떤 우연의 인연으로 나에게 오게 되었을까. 그 우연이 아니었다면 다른 접시들을 받게 되었을 텐데... 이 4 개의 접시들을 만나게 되어 더욱 기쁘다. 마치 어쩌다 보게 된 꿈속의 행성과 같은 모습을 한 이 접시들은 반복되는 일상에 내가 주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선물이다.
by. liis (life is like this)
'life is like thi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단장 to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한 첫번째 기록 (2) | 2020.07.26 |
|---|---|
| 과연 회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0) | 2020.06.28 |
|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0) | 2020.06.22 |
| 유아독존이라는 알에서 나온다는 것 (0) | 2020.05.26 |
| 좋은 날이 오려고 그러는 거야 (0) | 2020.05.25 |
| 여행을 갈 수 없을 때, 읽는다 (0) | 2020.05.20 |
| liis - 블로그 로고 디자인 (2) | 2020.04.11 |
| life is like this (0) | 2020.04.04 |